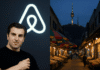요즘 시대에 일부러 느리게 마시는 술
술을 마시는 방식에도 나이가 생긴다.
젊을 때는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술을 고르느냐가 중요해진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마시느냐가 남는다.
요즘 술은 너무 빠르다.
잔은 가벼워졌고, 자리는 시끄러워졌다. 술은 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고, 마시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 연재는 그 속도를 잠시 늦추기 위해 시작한다.
레시피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술을 권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술을 둘러싼 태도와 멋, 그리고 자리를 대하는 방식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올드패션드는 단순한 칵테일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한 잔의 술 앞에서 서두르지 않는 태도이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취향이다.
요즘 시대에, 일부러 느리게 마시는 것.
그게 이 연재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다.
제 1편, 칵테일부터 이야기하자
멋을 아는 술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된다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술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술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순서다. 어떤 술부터 마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술을 배웠는지가 그 사람의 태도를 만든다. 그래서 이야기는 언제나 칵테일부터 시작하는 편이 옳다.
요즘 칵테일은 가볍게 소비된다. 달고, 예쁘고, 사진 찍기 좋다. 바에 앉아 메뉴판을 넘기며 색깔과 이름을 먼저 고르고, 잔이 나오면 한 컷 찍고 마신다.
칵테일은 대화를 만들어내기보다, 이벤트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래 칵테일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다.
칵테일은 술을 숨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술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증류주가 지금보다 훨씬 거칠던 시절, 사람들은 술을 다루는 방법을 고민했다. 설탕을 조금 더하고, 향을 얹고, 얼음과 물로 속도를 조절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칵테일이었다.
그래서 칵테일은 술의 입문서다.
어떤 칵테일부터 시작했는지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다. 첫 칵테일이 올드패션드였는지, 마티니였는지, 혹은 이름만 화려한 술이었는지는 이후 술을 대하는 자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클래식 칵테일의 공통점은 단순함이다. 재료가 적고, 맛이 직선적이며, 변명이 없다.
이 술들은 “맛있다”는 말보다 먼저 “어떻게 마실 것인가”를 묻는다. 잔을 드는 속도, 말을 멈추는 타이밍, 자리에서의 태도까지 포함해 하나의 분위기를 만든다.
반대로 요즘 유행하는 칵테일 중에는 설명이 너무 많은 술도 있다. 색깔과 향, 장식과 이름이 먼저 말을 건다. 물론 즐겁다. 다만 오래 남지는 않는다. 기억에 남는 술과 기록에 남는 술은 다르다.
칵테일부터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칵테일은 술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빠르게 취하는 법이 아니라, 천천히 마시는 법을 알려준다.
요즘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만, 술 앞에서 앉아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바는 시끄러워졌고, 잔은 가벼워졌다. 술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되었고, 대화는 술과 무관하게 흘러간다.
클래식 칵테일은 그 흐름을 멈춰 세운다.
잔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게 하고, 첫 모금을 서두르지 않게 만든다. 이 술들은 말을 줄이고, 자리를 지키게 한다.
그래서 칵테일은 멋의 출발점이 된다.
이 연재는 칵테일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왜 어떤 술은 사라지고, 어떤 술은 다시 돌아오는지를 이야기한다. 왜 지금 이 시대에 올드패션드, 마티니, 맨해튼 같은 술이 다시 언급되는지도 짚어본다.
술을 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잔을 드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야기는, 다시 칵테일부터 시작한다.
여행레저신문 ㅣ 이만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