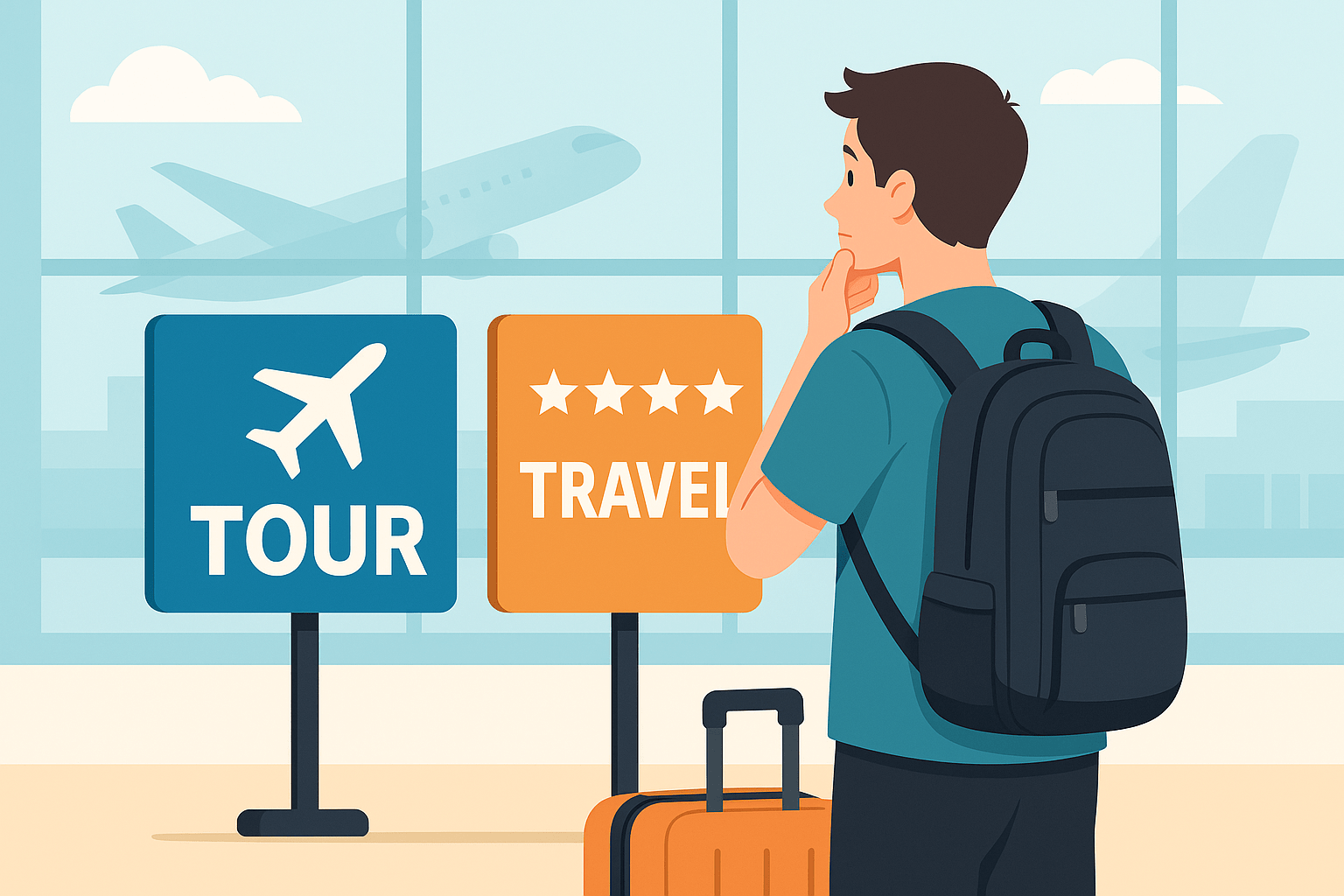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실크로드의 지층 위에 서 있는 나라.
카자흐스탄은 지금, 여행자들의 시선이 머무는 새로운 이름이다. 인구는 약 2천만 명. 세계 9위의 국토 면적(약 272만㎢)을 가진 이 나라는, 도시보다 풍경이 먼저 시야를 채우는, 인간보다 자연이 먼저 말을 거는 드문 공간이다. 초원과 사막, 만년설과 침엽수림, 붉은 협곡과 물속의 숲이 하나의 풍경 속에 공존하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시간과 지층이 교차하는 대륙의 정면이다.
카자흐스탄은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 유럽까지 약 6,500km에 이르는 실크로드의 핵심 경로에 자리 잡고 있다. 투르키스탄, 타라즈, 샤브락 등 고대 교역 도시들이 이 지역에 들어서며, 동서 문명이 교차하던 관문이자 유목과 정착이 맞닿은 접점이기도 했다. 이 ‘교차의 감각’은 지금도 카자흐스탄의 도시와 마을, 음식과 언어, 건축과 풍경 속에 다면적으로 살아 있다.
러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동서로 약 3,000km에 달하는 땅 위에 펼쳐진 고원과 협곡, 호수와 설산은 이 나라가 단지 크기만 큰 국가가 아니라, 기후와 문화, 언어, 종교가 혼재하는 거대한 풍경의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 중심에는 알마티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이자 여전히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이 도시는, 고산지대와 도시적 삶이 공존하는 색다른 출발점이다.
카자흐스탄 여행의 적기는 보통 5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 사이다. 여름의 고원은 햇살과 바람이 선명하고, 가을의 산은 황금빛으로 물든다. 겨울은 혹독하고 여름은 지역에 따라 무덥지만, 고산 지역에서는 한결 쾌적하다.
카자흐스탄에서 주목할 만한 풍경들은 단순히 ‘예쁜’ 수준을 넘어선다. 각각의 장소가 그 자체로 고요한 서사이자 시적인 울림을 품는다. 사진이 먼저 말을 걸고, 그 뒤에야 설명이 따르는 듯한 이 풍경들은, 경험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

차른 캐니언 (Charyn Canyon)
카자흐스탄 동남부 알마티 인근에 위치한 차른 캐니언은 약 1,200만 년 전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붉은 사암 협곡이다. 길이 약 154km, 깊이는 최대 300m에 달하며, ‘미니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릴 만큼 장엄한 절벽과 기괴한 암석 형상이 매혹적이다. 사막과 초원이 맞닿은 지형에 있어 해가 질 무렵에는 절벽이 붉게 타오르듯 물드는 광경이 연출된다. 하이킹 코스로도 잘 알려져 있다.
카인디 호수 (Lake Kaindy)
알마티에서 약 130km 떨어진 고산지대에 위치한 이 호수는 1911년 지진으로 형성된 이색적인 자연현상이다. 침엽수림이 침수되어, 호수 한가운데 고사목이 우뚝 솟아 있는 비현실적인 풍경을 만든다. 고요한 물빛은 초여름에는 녹색, 가을에는 남청색으로 변하며, 수면 위로 드러난 나무줄기는 마치 수묵화를 닮았다. 사진 애호가들과 자연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콜사이 호수 (Kolsai Lakes)
콜사이 호수는 ‘하늘의 거울’이라 불릴 만큼 청정하고 깊은 산악호수 세 곳이 계단식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다. 고도별로 호수의 색감과 주변 생태계가 다르게 펼쳐지며, 트레킹과 하이킹, 고요한 캠핑에 모두 적합하다. 특히 중간 호수까지 이어지는 8km 가량의 산책길은 숲, 계곡, 들꽃이 어우러져 여행자의 숨을 고르게 한다.
 침블락 (Shymbulak)
침블락 (Shymbulak)
알마티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침블락은 해발 약 2,260m에 자리한 고산 스키장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티엔샨 산맥의 절경이 펼쳐지며, 겨울엔 설산, 여름엔 고원 초원이 장관을 이룬다. 정상에서는 알마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인근에는 유럽풍 산장과 카페도 있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
 알틴에멜 국립공원 (Altyn-Emel National Park)
알틴에멜 국립공원 (Altyn-Emel National Park)
면적 약 4,600㎢에 달하는 이 거대한 국립공원은 ‘노래하는 모래언덕(Singing Dune)’과 ‘일곱 가지 색깔의 산(액토가이)’ 등 독특한 지형이 공존하는 자연생태의 보물창고다. 야생 말, 가젤, 독수리 등 멸종 위기 동물도 관찰할 수 있으며, 고대 암각화와 전설이 얽힌 유적지도 곳곳에 남아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카자흐스탄인가?
한국인 여행자들이 선호해온 일본, 베트남, 태국, 유럽과는 결이 다르다. 여기는 관광 인프라가 덜 정비된 만큼, 더 원형에 가까운 자연과 문화가 남아 있다. 한적하고 고요한 땅, 서두르지 않는 풍경, 오히려 그러한 낯섦이 지금의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여행자에게 깊은 쉼을 제공한다. 인스타그래머블한 맛집이나 쇼핑 대신, 사막의 바람과 호수의 거울이 남는 곳. 트레킹, 사진 여행, 문화 답사형 여행에 모두 적합하며, 개인이나 2~4인 단위 맞춤 여행으로도 유연하게 설계 가능하다.
물론 단점도 있다. 항공료는 평균 100만 원 전후로 비수기 특가를 제외하면 결코 저렴하진 않다. 언어의 장벽(카자흐어·러시아어)과 대중교통 미비, 예약 시스템의 불편함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동시에 이 땅이 아직 손때 묻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현재 인천 알마티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주 4회, 에어 아스타나가 주 3회, 이스터항공이 주 2회 운항 중이며 왕복 항공권은 평균 80만원에서 120만 원 선이다. 현지에서는 주로 전용 차량 투어나 렌터카 이동이 이뤄지며, 수도 아스타나와의 국내선도 운항 중이다.
화폐는 텡게(KZT), 대도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대부분 가능하다. 유심 또는 eSIM을 통한 데이터 사용도 비교적 원활하며, 공항이나 시내 대형 마트에서도 현지 유심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시차는 한국보다 3~4시간 느리며, 복장은 보수적일 필요까진 없으나 이슬람 문화권 특성상 일정한 절제와 예의가 요구된다.
카자흐스탄은 하나의 이미지로 규정되기 어렵다. 그 점이 바로 이 나라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질적인 자연, 다면적인 역사, 다층적인 문화가 어우러진 이 땅은, 지금 ‘여행’이라는 단어에 새로움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 듯 가까운 응답이 된다.
여행레저신문 l 이정찬 기자


















 정상에 오르자 세상이 넓어졌다. 저 멀리 일렁이는 지평선과 띠처럼 이어진 황금빛 사막. 그리고 언덕 반대편으로 펼쳐진 이리강 계곡이 언뜻 보였다. 모래 위에 나는 발자국이 쓸려가며 사라졌고, 그 순간 정말로 바람이 불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 같았지만, 이내 땅속에서 울리는 듯한 묘한 진동이 느껴졌다. 어렴풋하게, 낮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귀로 들린다기보다, 몸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노래’였다. 누가 부르는 건지, 어디서 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소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했다.
정상에 오르자 세상이 넓어졌다. 저 멀리 일렁이는 지평선과 띠처럼 이어진 황금빛 사막. 그리고 언덕 반대편으로 펼쳐진 이리강 계곡이 언뜻 보였다. 모래 위에 나는 발자국이 쓸려가며 사라졌고, 그 순간 정말로 바람이 불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 같았지만, 이내 땅속에서 울리는 듯한 묘한 진동이 느껴졌다. 어렴풋하게, 낮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귀로 들린다기보다, 몸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노래’였다. 누가 부르는 건지, 어디서 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소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했다.


 마카오정부관광청은 이날 ‘Macao Tourism + MICE Product Updates Seminar & Travel Mart’라는 이름으로 2025 마카오 위크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 여행업계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 깊어진 네트워크가 체감되는 자리였다.
마카오정부관광청은 이날 ‘Macao Tourism + MICE Product Updates Seminar & Travel Mart’라는 이름으로 2025 마카오 위크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 여행업계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 깊어진 네트워크가 체감되는 자리였다.















 음식은 때로 말보다 많은 것을 설명한다. 그 나라의 기후, 역사, 풍경, 사람. 몰타는 입으로 만나는 섬이었다. 다른 무엇보다 혀가 먼저 기억하는 섬. 한 끼가 한 계절 같았고, 한 모금이 한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음식은 때로 말보다 많은 것을 설명한다. 그 나라의 기후, 역사, 풍경, 사람. 몰타는 입으로 만나는 섬이었다. 다른 무엇보다 혀가 먼저 기억하는 섬. 한 끼가 한 계절 같았고, 한 모금이 한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카인디 호수엔 나무가 물속에 서 있고, 콜사이 호수의 물빛은 하늘보다 진하다. 침블락의 만년설은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압도한다. 차른 캐니언은 땅이 울리는 소리를 간직하고 있다. 알틴에멜 국립공원의 사막은 노래를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경관은 사진으로 보면 반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나머지 반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람을 맞고, 흙 냄새를 들이마시고, 그늘과 햇살의 경계를 천천히 걷고 있을 때만 체험할 수 있다.
카인디 호수엔 나무가 물속에 서 있고, 콜사이 호수의 물빛은 하늘보다 진하다. 침블락의 만년설은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압도한다. 차른 캐니언은 땅이 울리는 소리를 간직하고 있다. 알틴에멜 국립공원의 사막은 노래를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경관은 사진으로 보면 반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나머지 반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람을 맞고, 흙 냄새를 들이마시고, 그늘과 햇살의 경계를 천천히 걷고 있을 때만 체험할 수 있다.


 침블락 (Shymbulak)
침블락 (Shymbulak) 알틴에멜 국립공원 (Altyn-Emel National Park)
알틴에멜 국립공원 (Altyn-Emel National Park)

 고대 페르시아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진다. 왕궁의 창고에 보관되던 포도 항아리 하나가 변질되었다. 상한 냄새가 났고, 거품이 일며 부패한 액체로 여겨졌다. 궁중 무희 한 명은 실연의 슬픔에 목숨을 끊으려 그 항아리의 내용물을 마셨다.
고대 페르시아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진다. 왕궁의 창고에 보관되던 포도 항아리 하나가 변질되었다. 상한 냄새가 났고, 거품이 일며 부패한 액체로 여겨졌다. 궁중 무희 한 명은 실연의 슬픔에 목숨을 끊으려 그 항아리의 내용물을 마셨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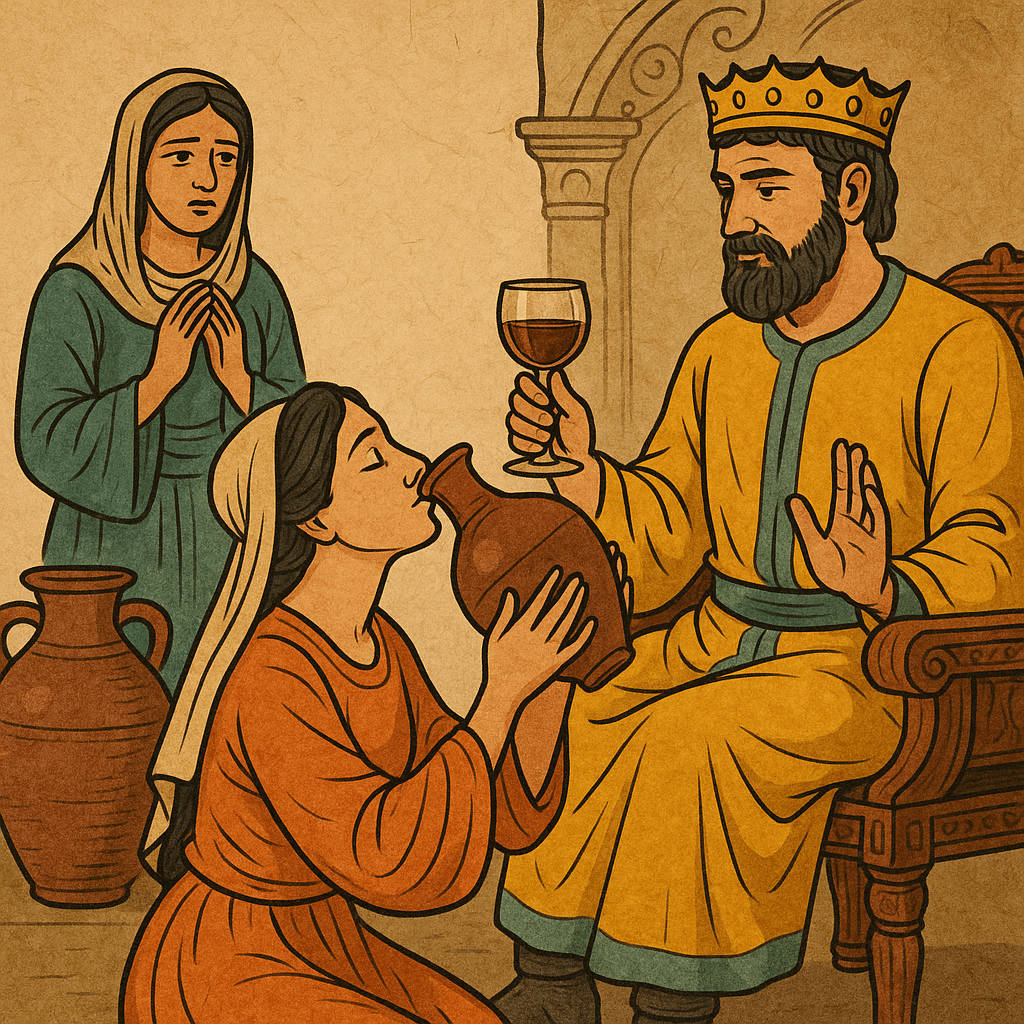 이후 유럽의 식민지 확장과 함께 와인은 지구 반대편까지 퍼졌다. 스페인은 남미로,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포르투갈은 브라질로 포도나무를 가져갔다. 이제 와인은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 호주, 캘리포니아에서도 자란다.
이후 유럽의 식민지 확장과 함께 와인은 지구 반대편까지 퍼졌다. 스페인은 남미로,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포르투갈은 브라질로 포도나무를 가져갔다. 이제 와인은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 호주, 캘리포니아에서도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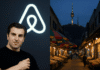

![[Travel Korea] Jongmyo: Walking into the Soul of Joseon](https://thetravelnews.co.kr/wp-content/uploads/2025/06/20231122142332001-100x70.jpg)